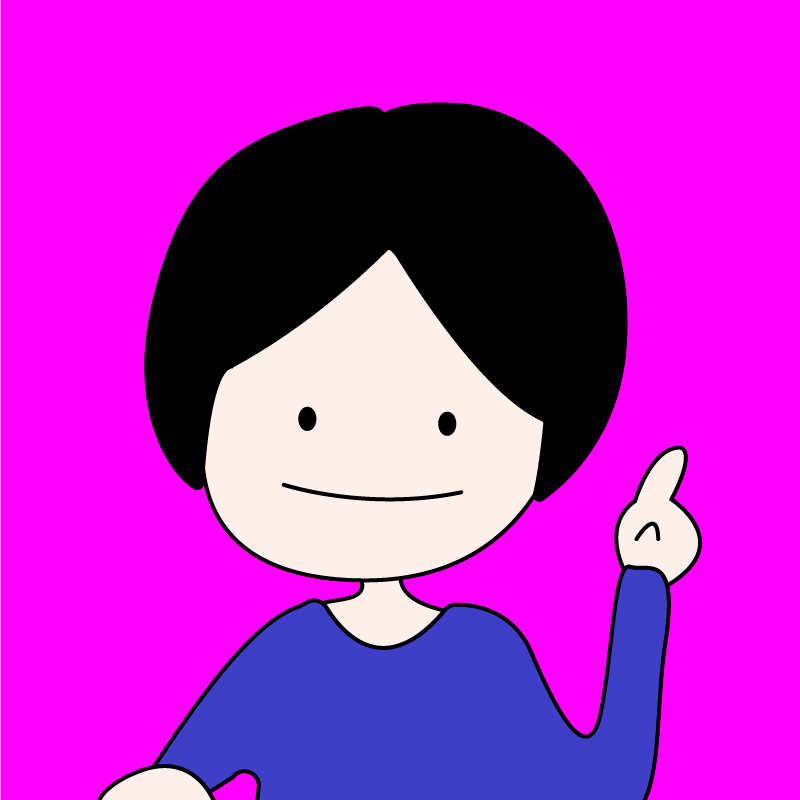"방금 그 말씀은 듣기가 좀 불편하네요"

충돌이 싫어 피하기만 했다.
갈등이 싫어 미루기만 했다.
모난 돌이 정 맞으니까.
동글동글해 보이는 것이 일단은 이로우니까.
그렇게 믿으며 40년을 버텼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아니다’ 싶었다. 잘못 살아온 것 같았다. 아무리 둥글둥글한 척, 모나지 않은 척해봐야 내 까칠한 본성은 숨길 수가 없었다.

나는 이중생활에 지쳤다. 생각은 이렇게 하면서 행동은 저렇게 하는 것, 속으로는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에 반대하면서 막상 나에게 그런 차별이 일어나면 정면 돌파를 피하곤 하는 것, 어떤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 앞에서는 온화한 표정으로 웃어주는 것 등. 마흔이 되자 남에게 어떻게 보일지 걱정하는 마음의 회로가 비로소 무뎌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기 시작했다. 마흔의 문턱을 넘으며, 나는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법을 훈련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기에.

나와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 출판사의 L 편집장과 모 언론사의 K 기자가 함께 모인 자리였다. 두 사람은 서로 이미 친했고, 나는 그날 K 기자를 처음 만났다. 그런데 갑자기 K 기자가 L 편집장을 ‘이 아줌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아줌마’라는 호칭이 서너 번이나 반복되니, 내 감정이 격해졌다. 나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방금 그 말씀은 듣기가 좀 불편하네요.
이분은 제가 많이 아끼고 존경하는 분이에요.
아줌마라는 호칭은 조심해주세요.”
사실 좀 더 조리 있게 설명하고 싶었다. L 편집장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아줌마가 아니라고. 일단 그분은 결혼하지 않았다.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독신 여성이었다. 그런 분에게 ‘아줌마’라는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쓴다는 것은 심각한 결례가 아닌가.
두 번째 이유. 사실 이 세상 어떤 여성도 공적인 자리에서 ‘아줌마’라는 호칭으로 불려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름에 ‘씨’를 붙여도 좋고, 직책을 붙여도 좋다. 그렇게 친하다면 ‘누님’까지는 어떻게든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줌마’라니, 어쩌면 그렇게 무신경하고 무례한지. 게다가 여성 쪽에서는 아무리 친해도 깍듯하게 ‘○○님’이라는 호칭을 고수하는데, 남성 쪽에서는 거침없이 ‘아줌마’라고 부르니 더욱 듣기가 불편했다.
“편집장님은 기자님을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저씨’보다 ‘아줌마’가
훨씬 듣기 거북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나에 대한 첫인상이 좋지 않겠구나’ 싶었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예전처럼 두렵거나 힘들지 않았다. 내 감정을 숨김없이 말했기에 속이 다 시원했다. 어느새 내 마음의 맷집이 강해져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안다. 내 의견을 솔직히 말하며 불편함을 견디는 것이 내 감정을 숨기며 평화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마흔의 자유로움은 이렇게도 찾아왔다. 더 이상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를 포장하는 일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게 된 것이다.

과거의 나는 ‘피스메이커(peacemaker)’가 되기를 원했다. 솔직한 싸움보다는 미봉책으로서의 평화를 선택했다. ‘싸움닭’으로 보이기 싫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쓰라린 내상(內傷)이었다. 나는 ‘센 언니’로 보이는 게 두려웠던 것이다. 저쪽에선 ‘웃자’고 떠드는데 이쪽에서는 ‘죽자’고 덤빈다는 비판을 받기 싫었던 것이다.

이러다가 나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센 언니’가 될지도 모른다. 드센 언니, 기 센 여자로 보여도 괜찮다. 내 의견을 포기하면서까지 누군가의 호감을 얻고 싶지 않다. 내 생각을 숨겨가면서까지, 내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되면서까지 환심을 사고 싶지는 않다. 나이 들수록 내가 점점 더 ‘진짜 나다운 나’로 바뀌어가는 것이 좋다. ‘나를 이렇게 봐주세요’라고 부탁하고 싶지 않아서 좋다. 아무런 꾸밈없이 그저 말갛게 ‘나’에 가까워지는 것이 참으로 좋다.
이 글은 정여울 작가의 <마흔에 관하여>의 일부입니다.
작가가 마흔이 되면서 겪은 이야기들을 담은 에세이입니다. 항상 영혼에 허기지고, 타인에 관심에 일희일비하는 젊은 이들에게. 마흔을 맞이할, 모든 이들에게 울림이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책읽찌라의 리뷰 영상도 들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