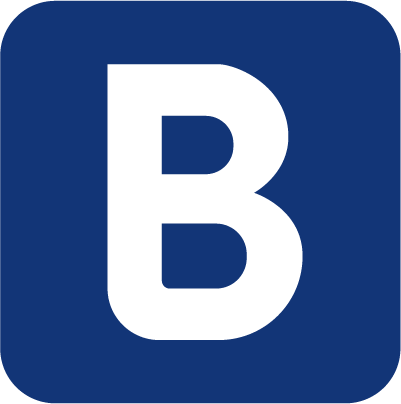[디카폐인] 마추픽추의 미친 가이드
<2> 잉카 트레일
잉카 문명의 고대유적이자 세계적인 관광지인 ‘마추픽추’. 남미 여행을 가는 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으로 꼽는 명소이기도 하다.
마추픽추는 버스로 가는 것이 제일 편하다. 아구아스 깔리엔떼스라는 도시에서 버스를 이용해 약 25분 정도 가면 마추픽추 입구에 도착한다.
반대로 힘들게 가는 코스도 있다. 옛날 잉카인들이 닦아놓은 산길인 ‘잉카 트레일’을 따라 걷는 것이다. 고산증에 시달리며 걸어야 하지만 잉카 트레일의 인기는 무척 좋다. 유적과 자연 보호를 위해 하루 입장 인원을 제한하기 때문에 6개월 전에 예약해야 트레킹 할 수 있을 만큼 희망자가 많다.
직접 참가해본 코스는 ‘킬로미터82’에서 출발해 마추픽추까지 45㎞ 거리를 3박4일간 걷는 ‘클래식 잉카 트레일’이었다.

드디어 출발하던 날. 걸음마다 즐거웠다. 힘들 것이란 걱정 따윈 아예 없었다. 마추픽추는 꿈의 여행지였다. 어린 시절, ‘태양소년 에스테반’이라는 만화영화가 인기였다. 주인공 에스테반이 잃어버린 잉카 제국의 황금도시를 찾아 떠나는 모험담은 언제나 가슴을 설레게 했다. 그때부터 딱 한 군데만 가고 싶은 곳을 고르라는 질문을 받으면 주저 없이 페루, 그중에서도 마추픽추라고 대답했다.
평생 원하던 곳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흥분감에 가슴이 떨렸다. 첫째 날은 걷기 쉬웠다. 출발지 고도(해발 2600m)가 좀 높아서 걱정했지만 경사가 심하지 않고 날씨도 좋아서 산책하는 기분으로 걸었다. 이 정도 난이도라면 뛰어가도 될 것 같았다.

하지만 본 게임은 둘째 날이었다. 우리를 인솔하는 가이드였던 에드가는 “오늘이 제일 힘든 날이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에드가의 입버릇은 “네버 어게인!(Never Again!)”이었다. 두 번 다시 올 일 없으니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고 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추픽추를 가고 싶어 하는지 기억하라고 했다.
하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다. 다음 야영지에 가려면 ‘죽은 여인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와르미와뉴스카(해발 4215m)를 넘어야 하는데 산소가 희박해서 오를수록 점점 어지러웠다. 에드가는 고산증이 너무 심하게 오면 내려가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며 쉬엄쉬엄 걸으라고 했다.
오르는 도중 힘들어서 쉬고 있었다. 숨은 차고 정신은 점점 흐려졌다. 정신력으로 체력을 커버한다는 말은 헛소리였다. 나중에는 ‘내 발로 걸어서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앞서 가던 에드가가 다가와 힘내라는 듯 이야기를 꺼냈다.

“내 동료 중에 건성건성 일하는 가이드 A가 있었어” 에드가는 그를 달갑지 않게 여긴 것 같았다. “그런데 언젠가 마추픽추에 도착했을 때, A가 와 있더라고.”
먼 산을 바라보면서 에드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헌데 그 게으른 A가 어떤 관광객에게 정말 열정적으로 안내하더라. 손짓발짓을 하면서 말야. 난 A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 처음 봤어. 미친 줄 알았다니까. A는 관광객에게 건물 모양이 어떤지, 돌을 얼마나 세밀하게 깎았는지 등을 설명하느라 아주 난리가 났지. 나중에 A에게 물어봤어. 대체 팁을 얼마나 받았길래 그랬냐고.”
난 축 늘어진 채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에드가가 들려준 A의 대답은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관광객이 물어봤대. 평생 바라던 곳에 왔다고. 그런데 시각장애인이라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 대체 어떤 풍경이 펼쳐져 있냐고….”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마추픽추를 가고 싶다는 열망을 막지 못했다. 에드가의 이야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추픽추 방문을 바라고 꿈꾸는지 깨닫게 해줬다. 난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조금씩 마추픽추에 다가가고 있다는 설렘을 상기하면서. 오랫동안 그리던 장소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