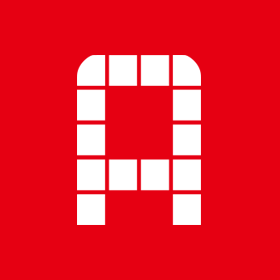무선(無線)의 시대가 불러일으킬 편리함의 중력



없을 무(無), 줄 선(線), 줄이 없으면 편하다. 무선 전화기, 무선 마이크, 무선 이어폰, 무선 청소기가 다 그래서 생겼다. 편하기 위한 중력에 이끌려 무선 제품은 탄생했다. 그리고 더 오래, 더 멀리, 더 잘 쓸 수 있는 무선 제품을 위해 더 좋은 무선 제품은 탄생한다.
시대의 시작
처음엔 줄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 처음엔 전기 자체가 혁신이었다. 전기를 동력으로 삼는 제품이 ‘먼 거리에서의 편리함’을 만들어냈다. 1837년 모스 부호를 고안하여, 1844년 64Km 떨어진 사람끼리 부호를 통해 정보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세계 최초의 유선전신이었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Alexander Graham Bell, 1847~1922)과 엘리샤 그레이(Elisha Gray, 1835~1901)가 1876년 미국에서 두 시간 간격을 두고 특허를 출원했던 전화는 목소리를 먼 거리로 전달하기 위한 기술이었다.

굴리엘모 마르코니(Guglielmo Marconi, 1874~1937)가 이탈리아에서 빛을 보지 못 하고, 영국에 이르러 역사적 획을 그었던 무선전신은 드디어 대서양을 사이에 둔 사람들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를 열었다. 그 전신망에 음악과 소리를 흘려보냈던 레지널드 페센든(Reginald A. Fessenden, 1866~1932)은 라디오 방송의 첫 단추를 꿰었다.
리 드 포리스트(Lee De Forest, 1873~1961)는 라디오 핵심부품 3극진공관의 특허를 취득하고 그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뛰어다녔다. 1910년 뉴욕에서 라디오를 통해 오페라를 들려주었고, 1915년부터 정기 음악방송을 시작했으며, 1916년 미국 미식축구 대회를 생중계했고, 미국 대선 선거 결과 방송까지 라디오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후, 소리의 증폭과 전자적 기술을 거듭한 수많은 기술자와 회사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라디오 방송을 정착시켰다. 20세기 초의 일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정보를 전달하는 기기는 모두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아 작동된다. 전기라는 에너지가 전신을 가능하게 했고, 전신 기술이 전화와 라디오의 등장을 자극했다. 하지만 전신기기를 다루기 위해서는 모스 부호와 각종 통신규칙 등을 공부해야 했다. 공부는 귀찮은 법이다. 그래서 전신은 사라졌다. 대신 일상생활처럼 말할 수 있는 편리한 전화 기술이 시대를 뒤덮었다.
라디오는 무선 전신에 음악과 노래를 전하고자 했던 열망으로 탄생했다. 그 열망은, 언제나 어디서나 음악방송을 들려주고 싶었던 방송시스템과 연결되어 라디오 방송의 시대를 열어젖혔다. 그 열망은, 언제나 어디서나 음악과 노래를 듣고 싶었던 카세트플레이어와 CD플레이어, MP3플레이어로 이어진다. 언제나 어디서나 음악과 노래를 듣고 싶은 사람은 20세기 초에도 있었고, 20세기 중반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콤펙트의 시대

‘워크맨(Walkman)’은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다. 즉, ‘카세트’의 개발이 워크맨을 탄생시켰는데, 카세트는 필립스의 콤펙트 카세트테이프 기술 개방으로 사용이 대중화되었다. 여유로운 삶을 즐길 줄 아는 음악 애호가들이 낭만의 상징으로 시대의 무덤에서 발굴하고 있는 그 거대한 LP판은 아무리 용을 써도 휴대용 플레이어로 만들 수 없었지만 카세트는 가능했다.
1979년 일본에 본사를 둔 회사가 워크맨 상표로 처음 카세트 플레이어를 대중화시켰다. 2010년대 단종되기 전까지 누적 판매 대수가 1억 대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후 수많은 경쟁사들이 워크맨과 비슷한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를 개발하고 출시하여 시장에 던지기 시작했다.

필립스는 콤펙트 카세트테이프 이후에 콤펙트디스크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CD’다. 그래서 워크맨을 만든 회사와 그 주변 회사들은 일거에 CD 플레이어를 만들었다. CD는 카세트테이프보다 더 많은 노래를 담을 수 있고, 그 노래를 듣는 사람이 그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간직한 세월 동안은 음질이 달라지지 않았다.
CD는 카세트테이프보다 품질이 더 우수했지만, 가로 세로 직경 크기는 그렇지 못 했다. 그리고 품질이 더 우수했지만 가격도 그만큼이나 더한 우위를 자랑한 바람에 카세트테이프를 시대의 무덤으로 몰아넣진 못 했다. 편리함을 즐기는 욕구의 차이에 따라 카세트와 CD는 함께 공존했다.

LP판의 물리적 크기를 축소시키고 성능을 진일보시킨 콤펙트 카세트테이프와 콤펙트디스크의 발명 덕분에 휴대용 플레이어 시장은 급격히 성장했다.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노래를 듣기 시작했다. 콘센트에 전선을 꽂지 않아도 노래를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워크맨과 CD 플레이어는 언제나 어디서나 쉽게 노래를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 20세기 후반 마지막 낭만을 선사했다. 그리고 21세기가 시작되자마자 이들은 모두 함께 시대의 무덤으로 직행한다.
보이지 않기 시작한 시대
사실, CD 직후에 ‘미니디스크’ 즉 MD가 있었다. MD는 카세트테이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명과 음질, CD보다 훨씬 작은 크기, CD에 필적하는 용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워크맨을 만든 회사가 이후 음원 재생기기 시장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자체 개발한 혁신적 제품이었다. 하지만 세상에 나오자마자 시대의 무덤에 묻혔다. 카세트와 CD의 패러다임을 극복하지 못 했기 때문이다.
카세트와 CD의 패러다임이란, 보이는 것에 대한 문제였다. 이제까지 휴대용 음원 재생기기는 재생 매개체의 물리적 크기를 넘어설 수 없었다. 카세트 플레이어는 카세트의 크기보다 커야 했다. 콤팩트 디스크든, 미니디스크든 ‘디스크’의 크기보다 휴대용 플레이어의 크기는 컸다. 자고로 뭐든지 크거나 무거우면 들고 다니기 불편한 법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편리한 극도의 휴대성을 원했다. MP3 플레이어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음원은 드디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냈다. 설마 개인 컴퓨터 시대가 도래하겠느냐는 ‘예언’을 조롱하듯 ‘PC’의 보급이 순식간에 이뤄졌다. 악기 연주와 노래도 컴퓨터에 저장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컴퓨터는 음원을 재생하는 기기로서의 역할까지 집어삼켰고, 기어코 사람들은 컴퓨터를 통해 노래를 듣기 시작했다.

그래서 MP3 플레이어는 이전까지의 모든 휴대용 음원 재생기기를 무덤에 묻어버렸다. 눈에 보이는 크기를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했던 그 모든 시도를 역사 속에 던져버렸다. 카세트와 CD, MD는 그렇게 사이좋게 시대의 무덤에 묻혔다.
물리적 크기가 존재하지 않는 MP3 파일은 궁극적인 휴대용 플레이어 시대를 열었다. 저장 공간과 음질, 인터페이스 등과 같은 전자적 기술이 그동안의 ‘크기’ 논쟁을 대신했다. 악기와 가수를 보지 않아도 멀리서 음악과 노래를 듣고 싶었던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마침내 그것을 언제나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크기의 시대
1837년 찰스 그래프턴 페이지(Charles Grafton Page)가 전류를 통해 소리를 전달하는 기술을 고안한 이래로 전화 기술은 전신을 뛰어넘어 발전하기 시작했다. 1876년 그레이엄 벨과 엘리샤 그레이가 거의 동시에 특허를 신청했을 무렵에는, 정해진 1대 1의 개인 간에만 제한적인 통신이 가능했다. 티라다 푸스카스(Tiradar Puskas)가 1878년 교환대를 발명하여 교환수의 수동 연결을 통한 1대 다수의 선택적 통신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899년 앨먼 스트라우저(Almon Strowger)는 교환수가 필요 없는 자동 다이얼 기술을 개발했다.

초창기 교환대까지 감안하면 ‘전화기기’ 전체의 크기는 정말 엄청난 것이었다. 이후 다이얼식 전화기가 가정에 보급되고 상용화되면서 크기를 줄였지만 여전히 송수화기와 전화기 본체의 전선은 살아남아 있었다. 가정용 전화기에 달려있던 전선이 없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다.
송수화기가 전화기 본체에서 독립될 무렵, 새로운 크기 논쟁이 점화되었다. ‘무선’ 송수화기의 그 엄청난 크기를 줄이는 것도 일이었지만, 드디어 송수화기를 독립시킬 수 있는 연구가 성공하면서 새로운 전화기에 대한 시도가 불붙은 것이다. 쉽게 휴대할 수 있는 전화기, 휴대전화, 즉 ‘휴대폰’이 등장했다.

1983년 세계 최초의 상용 휴대폰 ‘다이나텍(DynaTAC) 8000X’가 출시되었다. 드디어 언제나 어디서나 원하는 사람과 통신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들고 다니기엔 너무 크기가 컸다. 무게는 1Kg이었다. 이 벽돌을 시작으로 휴대전화의 크기 전쟁은 시작되었다.
1998년 노키아는 ‘노키아 5110’으로 전 세계 휴대전화 시장을 석권한다. 이전부터 노키아는 모토로라의 벽돌(그나마 작아지고 있었지만)을 상대로 더 작고, 더 감각적 디자인을 적용한 휴대전화 모델을 출시하고 있었다. ‘노키아 5110’ 모델 전에 출시된 ‘노키아 2100’은 이미 전 세계 약 2천만 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노키아의 휴대폰은 최초의 그것보다 크기와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진정한 ‘휴대’ 전화의 서막이었다. 비로소 사람들은 늘 휴대하며 자유롭게 전화를 할 수 있었다. 전화 기술의 크기가 안정되자, 이제 전화 외에 다른 기능을 동일한 크기에 집어넣는 춘추전국시대가 시작되었다.
그 전쟁의 제자백가(諸子百家)는 플립, 폴더, 슬라이드, 터치 등의 형태로 펼쳐졌다. 더 작게, 더 얇게, 더 가볍게 만드는 시도는 해가 바뀌기 무섭게 시장에 등장했다. 전화 기능 이외에도 수많은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추가되고,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제공되었다. 마치 워크맨에서 CD 플레이어까지 이어졌던 그 모습처럼 휴대 전화기기는 ‘더’, ‘More’의 끝을 향해 달려갔다.
크기가 중요하지 않기 시작한 시대
2007년 이후 그 수많은 제자백가 휴대폰들은 시대의 무덤에 끌려들어 갔다. 아이폰이 2007년 1월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크기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휴대폰’이란 것은, ‘휴대’하기 좋은 전화기다. 이제까지 휴대폰 제조사들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전화기’를 만들지 고민했다. 그런데, 20세기 초 전신이 그랬던 것처럼, 21세기 초 전화기도 그보다 더욱 포괄적인 통신이 요구되었다. 모스 부호를 통해 제한적 정보만 전하기 보다 직접 일상생활의 언어로 대화하기 원했기 때문에 전화는 전신을 대체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휴대 전화기기를 들고 다니면서 ‘전화’ 이외에도 더 많은 일을 하기 원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휴대폰을 대체시켰다.

휴대성의 크기 문제는 이제 끝났다. 크기가 무조건 작아야 하는 시대는 끝났다. 목적에 부합한 크기와 기능을 갖춘 전자제품이 크기의 논쟁을 끝냈다. MP3 플레이어와 스마트폰은 크기의 논쟁을 마치며 마침내 하나가 되었다.
무선 시대의 시작
이윽고 휴대하기 편한 전자기기들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뭘 하든 여전히 전선은 필요했다. 충전하기 위해 필요했고, 이어폰으로 노래를 듣기 위해 필요했다. 전자기기끼리 파일을 공유하기 위해서도 전선은 필요했다.
전자기기는 더욱 편리해야 한다. 편리하기 위해선 전선을 없애야 했다. 그래서 블루투스가 시작되었다. 블루투스는 1994년 에릭슨이 처음 개발한 단거리 무선 통신 기술의 산업표준을 일컫는 명칭이다. 에릭슨, 인텔, IBM, 노키아, 도시바 등의 주요 회사들이 모여 산업표준으로 만들었다. 이 산업표준은 ‘Bluetooth Special Interest Group; SIG’에 의해 관리된다. 블루투스 제품을 만들 때 제조사는 이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블루투스(Bluetooth)’라는 이름은 10세기 덴마크 왕의 별칭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블루투스의 표기는 당시 북유럽의 룬 문자로 하랄드 블라톤의 앞 글자를 표기한 문자를 차용했다. 이것은 인텔의 한 엔지니어가 제안한 것이었는데, 당시 난립하던 여러 무선 통신 규격을 통합하자는 의지가 반영되었다.
블루투스는 전자기기를 다루는 데 있어 극도의 편리함으로 나아가게 해준다. 선을 없앤다는 것이 얼마나 편리한 것인지 무선 충전기를 이용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찰나의 불편함뿐 아니라, 선을 꽂은 채로 당하는 자유의 제한마저 해소할 수 있다. 블루투스 이어폰과 블루투스 헤드셋은 내 귀와 손을 더욱 자유롭게 만들었다.
차량에 탑승할 때 블루투스는 탑승자의 스마트기기를 자동으로 인식한다. (물론 사전에 설정해야 하긴 하지만) 탑승 시점과 동시에 차량과 스마트기기가 연결되어 전화 송수신과 음원 재생이 자유롭게 가능하다. 운전과 통화를 자주 병행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이것이 궁극의 자유일지도 모르겠다.

리시버라는 아이템은 블루투스 기기가 아닌 것을 블루투스로 만들기도 한다. 유선 이어폰을 꽂고 리시버의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의 음원을 들을 수 있고, 리모트 컨트롤 기능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제할 수 있다. 선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게 만드는 기술의 시작이다. 물론 블루투스가 아직은 100%의 자유를 제공하진 않는다. 블루투스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이다.
보이지 않는 시대
그래서 무선의 시대에는 ‘근거리’라는 제약마저 사라져야 한다. 무선의 ‘불안정’마저 제거되어야 한다. 여전히 블루투스는 기기끼리 가까워야 하고, 선을 연결한 것보다 사진 전송 속도가 턱없이 느리고 소리가 갑자기 끊어지기도 한다.
무선 전화기, 무선 라디오, 무선 이어폰, 무선 헤드셋, 무선 충전기, 무선 마우스, 무선 청소기, 무선 마이크 등 이미 우리는 줄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노트북은 오랜 기간 동안 크기와 성능 못지않게 충전시간의 단축과 싸우고 있다.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처음에는 줄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 전기가 만들어 낸 혁신을 편리함으로 잇고자 한 시도였다. 그리고 이제 많은 줄을 없앴다. 줄이 없어도 전자기기가 움직이게 되었고, 줄이 없어도 통신이 이루어졌다. 문제는 ‘가능’이 아니게 되었다. 통신이든 먼 거리든 이젠 다 가능해졌다. 문제는 선이 없는 채로 얼마나 ‘오래’ 가능하냐는 것이 되었다.
전선을 연결하지 않은 노트북만큼 불안한 게 세상에 또 없다. 우리의 스마트폰은 식당에서, 회사에서, 집에서, 수시로 충전해드려야 옥체를 보전하신다. 현재 무선 전자기기의 관건은 ‘무선’ 자체가 아니다. 이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가 점차 주요 성능이 되고 있다. 얼마나 오랫동안 동력 공급을 할 수 있는지, 충전된 동력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가 무선 전자기기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이것이 무선의 시대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없어져야 한다. 모든 전자기기의 숙명은 ‘편리함의 중력’이다. 보이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 전신과 전화는 발명되었다. 그리고 전화기 옆에 붙어 대화하기 싫어서 무선 전화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언제나 자유롭게 대화하고 싶어서 휴대 전화기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언제나 자유롭게 전화 말고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싶어서 스마트폰이 탄생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의 마지막 숙제는 그 ‘존재’ 자체가 아닐까?
전화기, 카메라, 컴퓨터, 계산기, 시계, 통장, 메모장 등등 무엇이든 다 하나로 몰아넣어도 결국 그 ‘한 개’의 전자기기는 존재한다. 그걸 들고 다니는 것은, 안 들고 다니는 것보다 불편하다. 불편한 것을 편리하게 만들어온 역사가 바로 전자기기 발전의 역사다.
그 역사에는 항상 편리함의 중력이 있었다. 그 역사는 그 중력으로 움직인다. 카세트테이프든 CD든 들고 다니기 불편하다고 느꼈을 때 모든 노래는 ‘.mp3’ 안으로 들어갔다. 편리함의 중력은 마침내 물리적 형체마저 위협한 것이다. 지금은 화폐마저 물리적 형체를 위협받고 있다.
전력 공급을 편리하게, 공급된 전력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다가올 무선의 시대 전자기기가 안고 있는 과업일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 다가올, 보이지 않는 시대의 IT는 모든 물리적 형체의 제거를 필요로 한다. 그것이 궁극의 편리함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IT굴기를 보며 사람들은 중국의 ‘기술 베끼기’를 목놓아 성토한다. 하지만 워크맨을 처음 시장에 내놓은 그 회사도, 그 기술을 먼저 특허 등록한 브라질계 독일인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약 20년간 특허소송은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었고, 그 카세트 플레이어 기술이 더 이상 지구에서 쓸모 없어질 무렵, 특허소송 분쟁은 합의에 이르렀다. 워크맨을 처음 시장에 내놓은 회사는 일본의 소니社였다.



최근 인기 IT 동영상 리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