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와 화를 잠재워 주는 마법 같은 그 한 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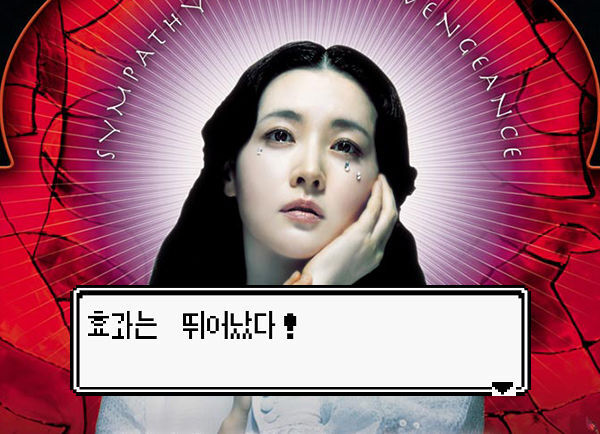
몇 해전, 중국에서 일할 때였다. 한국과 중국 합작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8개월간 중국 생활을 했다. 숙소인 호텔과 사무실만 오가는 단조로운 생활. 가끔 해외로 출장을 가거나, 숙소 근처의 마트가 있는 대형 쇼핑몰을 가는 정도가 유일한 외출이었다. 낯선 땅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한다는 건 상상 이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모두가 ‘프로젝트의 성공’이라는 목표 하나를 향해 달려가는 8개월간 참 많은 일이 있었다. 언어도, 환경도, 문화도 다른 사람들과 얼굴 맞대고 일을 하는 것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산재했다. 처음엔 그저 말이 안 통해서 생겨난 일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언어의 문제가 아니란 걸 알게 되었다. 서로 이해 안 되고 얼굴 붉히고 부딪히는 일이 자주 벌어졌다.

업계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한국팀과 공무원처럼 칼같이 일하는 중국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팀원 모두가 최단기간 최선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 달려가는 한국팀과 단계별로 책임자 컨펌이 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중국팀. 일하는 순서도, 방향도, 속도도 달라도 너무 다른 양국이 함께 프로젝트를 이어간다는 건 매일매일이 불가능과의 전쟁이었다.
중국이 바뀌고 변했다지만 우리 사이에는 분명 사회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등등 딱딱한 사회 이론의 명칭들이 존재했다. 다른 사회 체계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한 데 모여 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투성이였다.
분명 같은 시대, 같은 지구라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늘 그들과의 대화 끝엔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 “저 사람들 대체 왜 저러는 거야?”라는 물음표 가득한 대화로 이어졌다. 폭풍의 시간이 쌓여 가는 동안 팀 내에서 어느새 유행어처럼 번져간 말이 있다.

이 유행어의 창시자는 한국팀의 막내다. 성대모사를 잘했던 친구는 양희은 선생님 톤으로 이 말을 달고 살았다. 이해할 수 없이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화에 가득 찬 선배들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인물이다. 그 화의 여파는 고스란히 막내에게 미쳤다. 워낙 낙천적인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도 본인이 아무리 발버둥 쳐 봐도 변하지 않는 현실에 반포기, 좋게 말해 “내려놓음” 단계에 이르렀을 때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라고 했다.
한국팀 내에서 농담처럼 퍼져간 ‘응당 그럴 수 있지’의 효과는 실로 놀라웠다. 이유도 모르겠고 이해도 할 수 없는 그들의 행동과 말을 “응당 그럴 수 있지. 암 응당 그럴 수 있어~”라는 말로 우선 덮어 버렸다. 처음엔 각자 자신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농담처럼 했던 말들이 점차 한국팀의 분위기를 바꾸었다. 나비효과는 나아가 중국팀에서 영향을 미쳤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차오르는 분노와 깊은 화를 잠재워 주는 신비로운 마법을 부린 것이다.
만나면 서로 신경전에 기 싸움 하던 사람들이 서서히 웃으며 일하기 시작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닥치면 ‘대체 왜 저래?’처럼 뾰족한 말 대신 우선 ‘응당 그럴 수 있지’라는 말로 (100% 이해되진 않았지만) 상황을 인정했다. 그다음엔 재빨리 ‘자, 그럼 다음은 어떻게 할까?’로 해결책을 찾았다. 날 선 감정 대신 내려놓음을 가장한 포기 상태로 일을 진행해갔다. 부드러워진 분위기 덕분에 무사히 프로젝트를 마칠 수 있었다.

돌이켜 보면 프로젝트가 무사히 끝날 수 있었던 가장 큰 공신은 ‘응당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때의 경험 때문인지 한국에 돌아와서도 이해 안 되는 여러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중국 생활할 때의 그 마법 같은 말을 떠올려 본다. “말도 안 통하고 생각의 체계도 다른 중국 사람들과도 일을 어쨌든 해냈는데, 그에 비해 한국 사람들과 일하는 건 훨씬 수월한 일이야.”라고 스스로를 다독인다.
무슨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응당 그럴 수 있다. 깔끔하게 포기도 좋고, 거창하게 인정도 좋다. 까칠한 마음은 고스란히 뾰족한 말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내가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는 흉내라도 내면 상대방도 한결 부드러운 상태로 나를 받아 주게 마련이다. 이해 안 되는 걸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일은 꼬인다. 어쩌면 그럴 때는 좀 단순하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난감하고 이해 안 되는 상황에 닥칠 때, 속는 셈 치고 마법 같은 말을 던져 보자.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를 위해.

원문: 호사의 브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