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에이는 얼마나 착한 회사일까?


우리가 사무실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더블에이’라는 복사지가 태국 브랜드였다는 것, 아셨는지? 더블에이는 태국의 제지기업인 어드밴스 애그로(Advance Agro)사의 브랜드다. 태국 순후아센(SHS) 그룹 계열사로 1980년 설립되어 제지회사치고는 역사가 짧은 편인데 세계 복사지 시장 점유율 20%, 한국에서는 30%를 점유하는 1위 업체다.
일반적으로 제지회사는 환경을 마구 파괴할 것만 같은 이미지인 데다 개발도상국 출신 기업이라는 편견까지 덧씌워지면…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나설 것 같은 세련된 포지셔닝과는 거리가 있다. 그런데 더블에이는 선입견과 달리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면서 농민과 함께 성장한다고 해서 CSV(Creating Shared Value)의 좋은 사례로 소개된다.
CSV로 먹고사는 마이클 포터가 부러운, 그래서 직접적으로 CSV란 단어를 쓰지는 않는 필립 코틀러 아저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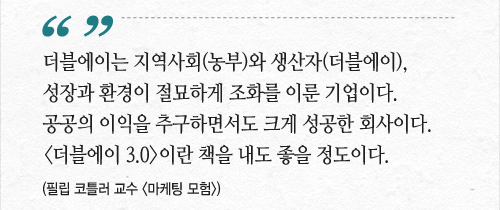
그런데 국내에 소개되는 자료들이 ‘착한 기업’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오해하는 내용이 꽤 보여서 바로잡아 볼까 한다. 비즈니스에 대한 무지 또는 오해는 해롭기 때문이다.
농민들 소득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건 아니다
일단 읽기 좋게 요약한 T Times의 카드뉴스를 먼저 읽어보시라.

제목부터 오해하기 딱 좋게 뽑았다. ‘농부들은 종이회사 더블에이 덕분에 14배를 더 벌었다’고 하면 농부들이 평소 벌던 돈의 14배를 더블에이가 벌게 해주었다는 뜻으로 들린다(달리 해석할 방법이 있나?). 즉 기회비용을 감수하고도 14배를 남겼다는 전설(?) 같은 비즈니스를 소개하는 표지라고 할 수 있다. 그 계산법은 아래와 같다.

묘목 매입원가가 5밧이고 매출이 70밧이라서 14배의 수입을 올린다고 계산했다. 다른 자료를 보면 50~70밧인데 이 카드뉴스는 인심 좋게 최대치만 소개한다. 이런 식이라면 우리나라 농민이 논 1ha에 심는 모 가격이 대략 90만 원(모판 300개×3,000원)이고, 가을에 수확하는 벼가 대략 600만 원(40kg 140포×4만3,000원)이니 벼농사로 6~7배의 수입을 올린다고 해야 한다. 누구나 다 알듯이 그건 턱도 없는 소리다.
물론 평소 아무것도 키우지 않던 논두렁이나 휴경지에 묘목을 심으니 땅값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유칼립투스 나무에 농약을 치거나 비료를 줄 것도 아니니 벼농사와는 많이 다른 원가구조를 가진다. 어쨌거나 농민 입장에서는 별로 큰 노력 없이 추가적으로 수익을 올린 것은 맞다. 얼마나 올렸을까?
같은 뉴스에서 이 칸나 프로젝트 덕분에 150만 농민이 매년 50억 밧을 더 번다고 했다. 농민 1인당 평균 3,300밧이다. 태국 농가소득 평균이 5만 3,000밧 정도니 (칸나 프로젝트 소득을 넣지 않았다고 보고) 약 6% 추가 소득이 생겼다. 여기서 우리는 ‘농부들은 종이회사 더블에이 덕분에 14배를 더 벌었다’라는 솔깃한 제목이 실은 농가 소득 전체가 14배로 늘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무를 심어서 6% 정도 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늘기는 했는데 처음과는 기분이 사뭇 달라지지 않았는가? 게다가 원래 나무 시장이 그렇다. 우리나라에서도 5,000원짜리 정원수 묘목을 심어놓고 5년쯤 기다리면 5만 원짜리도 되고 10만 원짜리도 된다. 그렇다고 10배 장사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 땅과 그 자금과 그 시간을 다른 데 썼으면 벌어들일 수도 있었던 돈, 기회비용 때문이다.
좀 더 계산해보자. 칸나 프로젝트로 인해 농민에게 1년에 추가로 생기는 3,300밧을 나무로 환산하면 약 50그루다. 3년 동안 키워야 하니 농가당 150그루 정도를 키우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나무 간격을 약 3m로 잡으면 450m. 논두렁만 따지면 네모반듯한 1ha 이상의 논이 필요하다.
더블에이가 그렇게까지 착한 회사는 아니다
T Times(와 다른 언론들)는 더블에이가 무척 착한 회사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더블에이가 인공림을 조성하려고 하다가 아래와 같은 두 가지를 고민한 끝에 칸나 프로젝트를 창안했다고 소개한다. 카드뉴스 제작자는 더블에이가 돌린 보도자료 그대로 받아 적은 현지 신문기사를 또 직역한 한국 신문기사를 전적으로 신뢰한 듯 보인다.

과연 실제로 그럴까? 더블에이는 태국 농민의 고달픈 현실을 타파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칸나 프로젝트를 창안했을까? 그랬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후발기업이 경쟁력을 획득하고자 노력한 결과 농민들의 소득을 올려주고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업을 고안하지는 않는다.
만약 더블에이가 1999년 제지업에 뛰어들면서 전통적인 펄프 생산법을 따랐다면 어땠을까? 일단 더블에이는 엄청난 땅을 마련해야 했다. 현재 농민들이 유지하고 있는 4억 그루를 더블에이가 직접 숲에다 키운다고 치고 나무 간 간격이 3m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서울시의 6배나 되는 약 36만 7,000ha라는 광대한 면적의 토지를 구매하거나 임차하거나 해야 했다. 아니면 그만한 토지를 가진 땅 주인들과 장기 구매 계약을 맺었어야 했다. 더블에이는 칸나 프로젝트를 만들어 이걸 피했다.
반대로 다른 비용은 어땠을까? 강원도보다 더 넓고, 우리나라 전체 경작지 160만 ha보다 한참 넓은 약 270만 ha 논의 논두렁마다 심은 나무를 동네마다 쫓아다니며 거둬들이는 일은 그 1/8 정도 면적의 밀식한 삼림에서 계획적으로 조림과 벌채를 하는 쪽보다 확실히 효율이 떨어진다. 관리와 물류에 드는 비용은 칸나 프로젝트가 전통적 조림 방식보다 많이 들었음에 틀림없다.
여기서 원가 문제는 ‘땅값 대 다른 비용’으로 귀결된다. 내부 정보가 없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땅값이 월등하게 큰 것은 확실하다. 제지업 같은 전통산업에서 후발주자가 단기간에 세계시장 점유율 20%를 달성하려면 (품질과 운영 외에도) 확실한 원가 우위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나무를 키우는 농민이 자기 전체 소득의 6%를 추가적으로 올리면서 만족해하는 동안 더블에이는 원료생산 방식을 경쟁사와 다르게 바꾸어 세계 최대의 복사지 제조기업이 되었다는 얘기다. 카드뉴스 제작자의 상상과는 다르게 칸나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자는 태국 농민이 아니다. 더블에이다.

그럼 칸나 프로젝트로 농민이 키운 나무를 다른 제지기업이 구매해 가면 어떻게 될까? 조금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순박한 태국 농민이 그렇게 배신을 하지 않을 거라고? 실제 계약서를 본 적이 없지만, 더블에이가 착한지는 몰라도 바보는 아닐 거다.
묘목을 팔면서 다 자란 나무의 구매선택권(Call Option)을 보유하고 있지 싶다. ‘더블에이 페이퍼 트리’라는 품종을 그래서 개발했다. 종자에는 지적재산권이 있으니 그걸 기반으로 조건부 매매계약이 가능하다. 더블에이가 다 자란 나무를 구매하는 가격이 시장 가격과 같으니 농민들에게 손해도 아니다. 농민들이 굳이 다른 구매자를 왜 찾겠는가?
그럼 더블에이가 태국 농민을 이용해먹은 악덕 기업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 더블에이는 제지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자사의 주요 고객이었던 농민들에게 추가적 소득원을 만들어주었다. 친환경적인 생산법을 개발해 농촌환경을 보호하였다. 결과적으로 착한 기업이다. 하지만 착한 기업이 되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본다. 후발주자로서 경쟁력을 더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마케팅에 주력한 결과다. 이게 중요하다.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성이 중요하다
우리 개발 협력계(좁게는 사회적 경제계라고 해야 하나…)에는 먼저 사회적 이슈를 정의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 활동을 디자인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파하는 분들이 있다. 만약 그런 관점에서 칸나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면?
우선 농민이 추가적으로 소득을 일으킬만한 작물을 선정하고, 그 작물을 개량하고, 재배 기술을 전파하는 데 주력한다. 작물이 본격적으로 생산될 무렵 가공과 유통 문제가 표면에 떠오른다. 그럼 그때부터 또 다른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공여국에서는 그 농산물을 사줘야 한다는 캠페인이 벌어진다. 착한 소비라는 이름으로.

농민은 그렇게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고, 소비자는 비싼 값에 면죄부를 구매하는 마음으로 방황한다. 정작 이 모든 일을 기획하고 수행한 (공정 무역 내지는 사회적 기업이라 불리는) 기업과 종사자는 또 다른 빈곤에 시달린다. 사업 종료와 함께 농민들의 수입은 사업 이전으로 돌아간다. 역시나 빈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만약 칸나 프로젝트에 개발 협력 관점을 투사하라고 한다면 약간의 디테일을 보강하고 싶다. 칸나 프로젝트가 농민 소득을 늘려주려면, 농민 각자가 논을 소유하고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만약 소작농이라면, 농지에서 발생하는 추가 소득은 농민이 아니라 지주에게 돌아간다. (조물주 다음이 건물주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농촌개발 사업의 숨은 수혜자가 지주가 되는 꼴을 우린 수없이 봐왔다. 만약 당신이 그 꼴을 보지 못했다면, 없어서 못 본 것이 아니다. 못 봐서 없다고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러니 이런 사업을 벌일 때는 소작농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사업 구도를 짜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신경 쓴다면 진정으로 착한 기업 타이틀을 달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다. 사업권(Good Will이 아닌 Goodwill)을 지키려는 연구개발, 원가를 절감하려는 혁신, 탄탄한 밸류체인관리,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마케팅 등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는 만족을 얻는다. 물론 그 만족 수단은 대부분 돈이다. 돈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만 가치를 중개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개발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느 정책 수단처럼 사회적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는 대부분의 접근법은 별로 효과가 없다. 그렇지만 소득을 늘리면 대부분의 사회적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 소득은 시장에서 생긴다. 어떤 사업이든 시장 기능을 활용해야 지속 가능하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통한 개발 협력이 중요하다. 2018년 개발마케팅연구소는 더욱 이 관점에 주력하고자 한다.

원문: 개발마케팅연구소
